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조선 시대 해시계 ‘앙부일구’ 3점 등 모두 5점을 30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했다.‘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높이 3.4미터 대형 불상으로, 조선 후기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중 건축 부재에서 ‘분황사상량기’(1616년)와 ‘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1680년) 묵서가 확인돼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광해군 1) 5360근 동을 모아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분황사는 신라시대부터 자장율사, 원효대사 등 여러 고승들의 수행처이자 중요한 가람으로 인정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 명찰이다. 원래 이곳에 봉안되었던 금동약사불은 정유재란(1597년)으로 소실됐지만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약사도량으로서 분황사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란 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처럼 장대한 규모로 복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규모가 커 우람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달리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어깨가 왜소해 전반적으로 동안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아이처럼 앳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불상 양식이,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 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양식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신.구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16년과 1680년에 작성된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 1609년에 동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경위와 불상의 명칭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함께 보물 지정 예고된 앙부일구는 모두 3점으로 각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이 가운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 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는 ‘앙부일영’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 이천, 이순지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겉면에 ‘북극고 37도 39분 15초’라고 새겨진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해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워낙 수량이 많아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보물 지정 예고 대상 <자치통감>은 현재까지 해당 권이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미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해 서지적 가치 또한 높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박지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아냐…서방유학 추정 아들 은폐"](/news/data/20250909/p1065576049058857_654_h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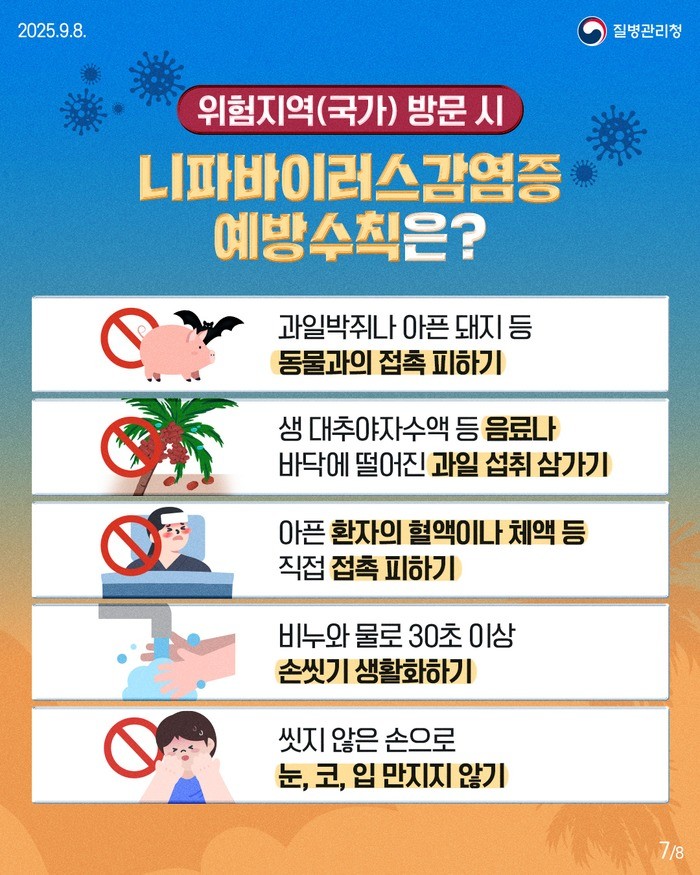
![[Issue Hot] '질 나쁜 나랏빚'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news/data/20250908/p1065568328401949_414_h2.png)
![[Issue Hot]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위헌’ 논란](/news/data/20250906/p1065582256610039_43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