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뿐인 생명을 빼앗는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노자의 철학
장자는 "생사일여(生死一如, 생과 사가 결코 다르지 않다)"의 해탈의 경지를 주장,
...그에 반해 노자는 철저히 '생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
공자, 노자에게 '법(法)'이라는 것은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 '법' 자체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자 함께 읽기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려면, 미리 좀 읽어야 한다. 지난 주에 제72장까지 읽었으니, 어서 남은 장을 미리 읽어야 한다. 그래 오늘 아침은 <<도덕경>을 펼쳤다. 제74장을 읽고 공유할 차례이다. 이 장의 키워드, "사살자살(司殺者殺)"은 '사형은 사형집행인에게 맡기라'라는 말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목수를 대신해 대패질을 하면 손에 상처를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일은 책임자에게 맡기라는 거다. 노자의 '무위(無爲) 정치'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지 말고 책임자를 시켜서 집행하라는 의미가 있다. 법 집행은 법관이 하고, 경제는 경제 관료에게 맡기고, 사형은 사형집행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다. 내가 모든 일을 주재하려 하거나 간섭하고 끼어든다면 결국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아가 큰 저항을 만나게 된다.
자신은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능력에 맞게 역할을 주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위 정치'가 아닐까? 경영학 용어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 부여, 권한 하부 이양)가 아닐까? 한 사람의 통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최고 통치자의 역할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 첫 문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民不畏死(민불외사) 奈何以死懼之(내하이사구지)"이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는가?'로 풀이 된다. 도올 김용욕의 번역을 보니, 나에게는 금방 그 뜻이 와 닿았다. "백성들이 통치자의 학정으로 인하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노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역시 결론은 '무위'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다. 하나 뿐인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노자의 기본 철학이다. 그러면 사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늘 즉 '도'다. 사형은 하늘의 섭리에 맡기고 국가는 '무위'해야 한다고 본다.
도올 김용옥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장자와 노자의 큰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장자는 "생사일여(生死一如, 생과 사가 결코 다르지 않다)"의 해탈의 경지를 주장하는데 반하여, 노자는 철저히 '생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죽음과 삶이 같아지는 초월의 경지가 아니라, 죽음을 멀리하고 삶 다운 삶을 갈망하는 철학이라는 거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 '허', '무욕', '자연', 이 모든 것이 삶의 문제이지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정치론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자는 삶의 현실을 궁극적인 문제로 삼기 때문에 정치철학이 있고, 그의 법제(法制)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민중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극한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을 또다시 통치권력이 죽음으로 위협한다고 그것이 먹힐 일이 없다는 거다. 노자는 이미 법치주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앞의 상황과 반대이다. "若使民常畏死而爲奇者(약사민상외사이위기자) 吾得執而殺之(오득집이살지) 孰敢(숙감)"이다. 이 말은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만일 그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그 자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겠는가?'로 풀이 된다. 이 해석도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도올의 의역을 했지만, 이런 말 같다. "만약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온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사악한 짓을 하는 놈이 있다면 나는 그 놈을 붙잡아서 법에 의하여 처형하고 말 것이다. 과연 누가 또다시 사악한 짓을 감행하려 할까?"
여기서 "위기자(爲奇者)"에 대해 왕필은 "괴이한 짓으로 민중을 어지럽히는 놈"이라는 주를 달았다 한다. 그런 놈이 있다면 내가 곧 잡아 죽여버린다. 그렇게 과감하게 형벌을 집행하면, 어느 놈이 감히 그런 사특한 짓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이런 뜻이 바로 "숙감(孰敢)"에 담겨 있다는 거다.
다음 문장처럼, 지도자가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마치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다가 자기 손을 다치는 결과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무위'란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간섭과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일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문장은 "常有司殺者殺(상유사살자살) 夫代司殺者殺(부대사살자살) 是謂代大匠斲(시위대대장착) 夫代大匠斲者(부대대장착자) 希有不傷其手矣(희유불상기수의)"이다. 이 말은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인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자 치고 그 손 다치지 않는 자 없을 것이다'로 읽는다.
노자가 살던 시대에 군주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였던 같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처형하고, 반역이 의심된다고 사형을 명령하기도 했는가 보다. 이런 감정에 의한 처형의 폐단은 결국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자멸을 초래했다. 사형은 적법하게 처리 해야지, 군주가 나서서 직접 사람을 죽인다면 결국 그 보복은 군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司)"는 '담당자'란 뜻이고, "살(殺)"은 사형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사살(司殺)"은 '사형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이다. 사형의 결정과 집행은 "사살"에게 맡겨 집행하면 누구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원한을 가진다고 해도 군주가 아닌 집행인에게 가질 것이다.
도올 김용옥은 "사살자(司殺者)"는 비유적인 어법으로 법을 초월하는 "천망(天網)"으로 읽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잘 관찰했듯이 근대국가는 감옥이라는 장치와 사형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사형은 차츰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사형을 폐지했고, 기타 많은 국가들도 형벌로서는 존속시키지만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후자에 속한다.
사형제도가 있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근거를 노자는 종교인들의 순교적 행태에서 찾고 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도 그런 유형의 인물들은 많았다. 묵가를 따르는 무리들이 대표적이다. 노자도 그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반인륜적이므로 폐지하고 하늘의 손(사형집행인)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면 손에 상처를 입는다'는 문장은 '섭리에 따른 사형 집행인인 하늘을 대신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힌다.
도올 김용옥에 의하면, 공자에게나 노자에게나 '법(法)'이라는 것은 '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법 그 자체를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인적 인권의 모든 요소를 법으로써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법은 돈과 권력에 아부하는 노리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법은 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제만으로 민주는 달성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어야 한다. 대안은 법이란 법을 없애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무위의 철학을 체득하는 것이다. 법관이 대패질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들의 손을 상하게 하는 서툰 사람일 뿐이라는 겸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침 산책 길에서 이런 생각에 깊게 빠져 있다가, 오늘 아침 사진의 감나무의 감을 만났다. 나는 감나무를 볼 때 애잔하다. 오늘 아침 시처럼, "참 늙어 보인다/하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그리고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애처롭다. 나는 세상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감나무라고 본다. 자기 것을 다 쏟아내고, 비우면서 저 붉은 열매, 감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감나무/함민복
참 늙어 보인다
하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멈칫멈칫 구불구불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름터
늙수그레하나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떫다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 다짐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않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 분질러 버린다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쪼며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보라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 버린 듯 묵묵부답 동안거에 드는
다음은 제74장의 원문과 번역이다.
民不畏死(민불외사) 奈何以死懼之(내하이사구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는가?
若使民常畏死而爲奇者(약사민상외사이위기자) 吾得執而殺之(오득집이살지) 孰敢(숙감):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만일 그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그 자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겠는가?
常有司殺者殺(상유사살자살) 夫代司殺者殺(부대사살자살) 是謂代大匠斲(시위대대장착) 夫代大匠斲者(부대대장착자) 希有不傷其手矣(희유불상기수의):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인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지 않는 일은 드물다.
https://pakhanpyo.blogspot.com 에 있다.
 |
| ▲ 박한표 교수 |
<필자 소개>
박한표 교수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경희대 겸임교수 )
공주사대부고와 공주사대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취득 후 프랑스 국립 파리 10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 문화원 원장, 대전 와인아카데미 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박지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아냐…서방유학 추정 아들 은폐"](/news/data/20250909/p1065576049058857_654_h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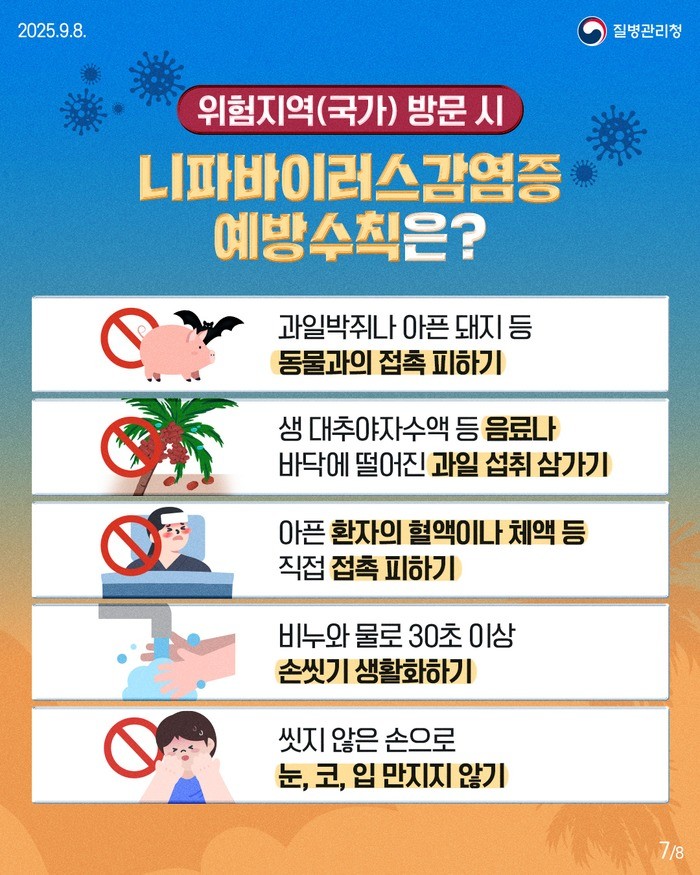
![[Issue Hot] '질 나쁜 나랏빚'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news/data/20250908/p1065568328401949_414_h2.png)
![[Issue Hot]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위헌’ 논란](/news/data/20250906/p1065582256610039_43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