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왜 여기 웅덩이가 있느냐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
'목표'가 흔들려도 '목적'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을 물로부터 배운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휴식을 즐기는 여유와 고요다
늘 징징거리는 사람은 정작 타인의 울음은 듣지 못한다
흐르는 물처럼 고요함이 없는 마음에 우리의 모습은 비쳐지지 않는다.

물은 여유가 있다. 물은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간다. 물은 왜 여기 웅덩이가 있느냐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 물은 그저 말없이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 할 일을 못했다고 조급해 하는 인간과는 대조적이다.
물은 궁극적으로 바다에 도달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갖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올라간 물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궁극적인 꿈의 목적지인 바다에 이르러 하늘로 올라가는 물의 꿈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매일 흐르는 물에게는 오늘 도달할 곳과 내일 도달할 곳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오늘 흘러가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다 때가 되면 다시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물은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흐를 때도 있다. 물은 좁은 길을 만나면 물살이 빨라지고, 넓은 강을 만나면 산천초목을 다 굽어보면서 유유자적 흘러간다. 물은 수심이 얕고 물길이 좁은 곳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수심이 깊고 넓은 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물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기 때문 같다.
물은 비록 오늘 달성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목표'가 흔들린다고, '목적'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을 물로부터 우리는 배운다. 오늘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내일 달성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잃지 않는 자세이다. 물은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도 물처럼 여유를 갖고 천천히 흐르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왜 사는 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물에는 오늘 달성해야 될 목표와 이루어야 할 성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목표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찾아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저 물은 흐를 뿐이다. 오늘도 물처럼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살고 싶다.
스포츠에서는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게임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집중'이다. 이 말은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다. 그냥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말이다. 목표를 보지 말고, 눈 앞에 해야 할 일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대 담론보다 눈 앞의 일에 우선 집중한다. 팀 페리스는 말한다.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이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은 계획을 싹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빅 픽처의 그림이나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point of impact-테니스에서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 눈 앞의 일에서 벌어지는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진다. 곧장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난다. 실수한 날이 지나,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신은 앞 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 놓는다. 살아 보니 그렇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지쳤다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막상 시간이 나면 잘 놀지 못한다.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쉬는 것'에 대해 진진한 사유를 해야 한다. 잘 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요소가 만족돼야 한다고 하지현 정신과 교수는 말한다. "'매일, 짧게, 혼자'이다. 그 반대 '어쩌다, 길게, 여럿'이다." 일상의 피곤함은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긴 휴식으로 단번에 털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금씩 자주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람이 여럿이 모여야 쉴 수 있는 것은 관계 유지에 들 수밖에 없는 에너지로 휴식의 효과가 반감된다. '혼자 있기'는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디톡스가 될 수도 있다. 관계의 피로도 휴식의 대상이다.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은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은 것처럼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게 한다. '매일, 짧게, 혼자'하는 휴식을 권한다. 각자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텃밭에 가기, 짧은 산책과 맨발 걷기 등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동네 주변에서 휴식을 취한다. 특히 조용한 곳을 산책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겁다.
현대인의 휴식 시간은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많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휴식을 즐기는 여유와 고요이다.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도 끊임없이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게 돌아다닌다. 휴식을 위한 여행에서도 쉬지 못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온다.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고요에서 나온다. 고요는 바깥의 소음과는 상관없다. 고요는 마음만 먹는다면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일상 중에 잠시 고요를 즐겨야 한다. 다음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머무름(멈춤)을 안 뒤에야 자리를 잡는다(知止而後有定).
자리 잡은 뒤에 야 능히 고요할 수 있으며(定而後能靜),
고요한 뒤에 야 능히 안정이 되며(靜而後能安),
안정된 뒤에 야 능히 생각할 수 있고(安而後能慮),
깊이 사색한 뒤에 야 능히 얻을 수 있다(慮而後能得)."
'정좌관심(靜坐觀心)',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 본다. 마음을 안정한 후에 생각을 가다듬는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별과 달은 그 물이 잔잔해야 제대로 비쳐진다. 매일 시간을 가리지 말고 한 시간 정도 정좌하라. 아니면 고용한 곳에 가라.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가난 속에서도 마음은 가을 물처럼 맑고, 고요해진 마음은 봄바람처럼 부드럽다.
<장자>에 "감어지수"라는 말이 있다. 흐르지 않고 고요한 물에 사람들은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다.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춰 볼 수 없는 것처럼 고요한이 없는 마음에 우리의 모습은 비쳐지지 않는다. 나는 주말 농장이란 이름인데, 주중에 그곳에 가면, 영문 모른 환대인 고요함을 맛본다. 그 무조건적인 환대는 애 영혼의 깊은 곳을 툭 건드리고, 고단하고 외로운 나를 쉬게 한다. 진정한 쉼은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카프카가 그랬다. 평안, 정적, 휴식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성급함은 인류의 중죄라고 말이다. 우리는 자기 짐을 이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살아간다. 그 짐을 내려 놓으려면 침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문제는 소란에 길들여진 영혼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침묵의 길에 들어서려면 세상을 행한 감각의 창문을 모두 닫고, 자신의 내면만을 응시하면서, 어떤 '은밀한 소리'를 들어야 하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노자의 행복론도 "치허극, 수정독(治虛極, 守靜篤)"이다. "욕심을 버려 마음을 비우고, 맑고 고요한 상태를 굳세게 지켜라"는 뜻이다. 사실 욕심을 비우면 존재가 채워지고, 고요함을 지키면 삶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면, 그 양만큼 존재가 자리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는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다. 문제는 근데, 그걸 얻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목표를 찾아 나서는 첫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지혜"이다.
오늘은 좋은 계절인 10월의 첫 토요일이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 가지 마을 일들이 있다. 우리마을대학 토요학교 와인 강의가 있고, 동네에서 신성마을넷이 주관하는 플리마켓이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고 오랜만에 주말농장에 갈 거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좀 고요함을 즐길 생각이다. 늘 징징거리는 사람은 정작 타인의 울음은 듣지 못한다. 자신의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면 타인의 목소리가 묻히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필요한 건 적당한 양의 침묵이다. 대화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나의 어떤 말을 ‘기억’ 하느냐이다. 말없이 친구의 말을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데 대화가 끝날 무렵 친구에게 “오늘 조언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저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가 울 때 손을 잡은 게 전부였는데도 말이다. 이런 대화에서 침묵은 제3의 청자다. 이런 게 "지혜"일 것이다.
지혜/세라 티즈데일
내가 불완전한 것들에 대항하느라
내 날개를 꺾어버리는 일을 그만둘 때,
좀처럼 열리지 않는 문 뒤에서 타협하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한 고요함과 매우 냉철한 지혜의 내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삶은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준다.
삶이 가져간 젊음 대신.
 |
| ▲ 박한표 교수 |
<필자 소개>
박한표 교수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경희대 겸임교수 )
공주사대부고와 공주사대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취득 후 프랑스 국립 파리 10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 문화원 원장, 대전 와인아카데미 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박지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아냐…서방유학 추정 아들 은폐"](/news/data/20250909/p1065576049058857_654_h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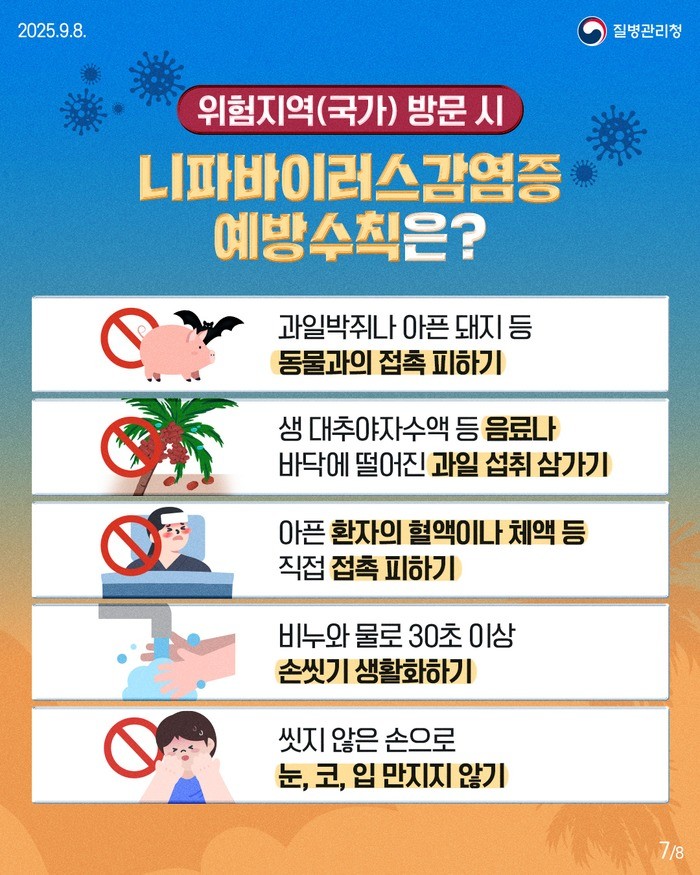
![[Issue Hot] '질 나쁜 나랏빚'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news/data/20250908/p1065568328401949_414_h2.png)
![[Issue Hot]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위헌’ 논란](/news/data/20250906/p1065582256610039_43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