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方)이란 처방이나 약방문(藥方文)을 뜻한다. 이런 의서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제공했다. 그중 ‘신라법사방’에는 ‘복약주문’(服藥呪文)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귀신의 작용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민간 처방이 유행했다. 중국의 ‘진서(晉書)’ ‘예지(禮志)’에는 정월 초하룻날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를 꽂아 놓으면 한 해 동안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섣달 그믐날 밤에 벽온단(피瘟丹)을 술에 타서 마시면 이듬해 한 해 동안 온역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역질이 돌면 우리 선조들은 촌사(村舍)로 나가서 외부와 접촉을 피하면서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갈암 이현일이 쓴 ‘선교랑(宣敎郞) 노형필(盧亨弼) 행장’에 의하면, 노형필이 부친상을 당했던 인조 21년(1643) 전염병이 돌았다. 그는 부친의 영위(靈位, 신주)를 받들고 촌사로 나가 피해 있으면서도 조석으로 전(奠, 술과 과일을 차리는 것)을 올리면서 곡을 그만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다. 그러나 끝내 무사하자 효성 때문에 하늘에서 돌봐 준 것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행정제도에 대해서 쓴 ‘경세유표’(經世遺表)에 ‘역역지정’(力役之征)이란 조항이 있다.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인 역역(力役)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에 “흉(凶)과 찰(札)이 있는 해에는 역정이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 당나라 가공언(賈公彦)은 그 주석에서 “흉은 그해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이고, 찰은 천하에 역병(疫病)이 유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곡식이 익지 않았거나 역병이 유행한 해에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잖아도 좋지 않던 경제가 코로나19까지 덮쳐 최악의 상황이 됐다. 조선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것임은 물론 내년엔 나라 살림을 줄여 세금도 대폭 감면했을 것이다.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조정은 활인서(活人署)를 설치해 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매일 죽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활인서까지 나와 죽을 먹기 힘든 양반가 부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죽을 제공했다고 한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린 행정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박지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아냐…서방유학 추정 아들 은폐"](/news/data/20250909/p1065576049058857_654_h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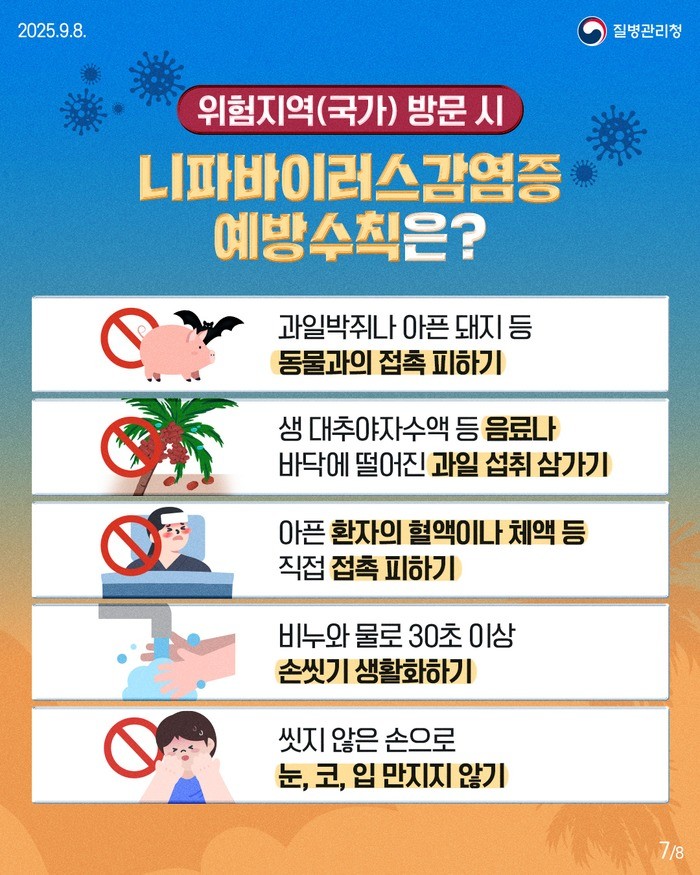
![[Issue Hot] '질 나쁜 나랏빚'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news/data/20250908/p1065568328401949_414_h2.png)
![[Issue Hot]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위헌’ 논란](/news/data/20250906/p1065582256610039_43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