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끼어들었다가 흠씬 두드려 맞고 고꾸라졌던 김치삼이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저고리가 훌러덩 벗겨져 웃통이 알몸인 체였고 바지는 찢어져 가랑이의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강경포의 저잣거리는 대단했다. 지난번하고 또 달랐다. 어느 틈에 저잣거리가 더 생겨나 있었고 거리마다 주막과 여각이 들어서 있었다. 일본인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쇳덩이로 만든 까만 배가
 |
▲ [장편 연재소설-이성수] 칠십일의 비밀 <02> |
김석순은 너울가지가 있다. 성격이 서글서글했다. 언변이 좋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곧잘 읽어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장날마다 가만있지를 못했다. 사람 구경이 좋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는 것이 좋았다. 장시를 쫓아 다녔다. 주변에서 상인이 되어보라며 권유했다. 김석순도 부보상이 되어 보려고 했었다. 비록 고달프고 위험하며 천대를 받는 일이기는 해도 세상 물정을 살피기에 그만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 사귈 수 있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무나 부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연줄이 있어야 했다. 연줄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재물을 바쳐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애를 쓰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석순의 처지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결국, 스스로 장삿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전주는 물론이고 강경포와 군산포를 여러 차례나 다녀왔다. 어렵사리 장삿길을 찾아냈다. 처음으로 나서는 참이었다. 그런데 부보상단이 그마저도 가로막고 있었다.
- 보따리 못봤는가요? -
십여 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이 들자마자 보따리를 찾았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입술이 터지고 여기저기 찢어진 곳에서는 피가 고여 말라붙어 있었다.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다. 다행이었다. 김석순은 죽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선착장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으나 텅 빈 부두였다.
- 아이고 인자 어쩌게 살아야 헌다냐? 휴 -
김석순은 억장이 무너졌다. 보따리에는 인삼 몇 뿌리가 들어 있었다. 김석순의 전 재산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었다. 송상(松商 개성을 중심으로 장사하던 상인)에게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만든 기회였다. 겨우 마련한 장사밑천을 잃어버렸다. 군산포나 강경포에서는 일본인에게 갑절도 더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만 되면 빚으로 넘어간 밭을 되찾을 수가 있고 하루 세끼를 챙겨 먹을 수도 있다. 또 세금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본래 김석순은 굶고 사는 형편이 아니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밭뙈기가 서너 마지기나 있었다. 그럭저럭 살아 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세금이 많아졌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갖가지 세금 명목이 더 늘어났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없었다.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다.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 추수를 해봤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결국 환곡(춘궁기에 빌려주고 추수기에 회수하는 구휼제도)에 의탁해야 했다. 점점 그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빚을 냈다. 화근이었다. 빚을 갚아도 늘어나기만 했다. 마치 장마에 물이 불어나는 것 같았다. 결국, 손바닥만 한 밭뙈기 하나가 남았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여 장삿길에 나섰다. 인삼을 강경포나 군산포에서 일본인에게 내다 팔면 이문이 곱절이 남는다는 말을 들었다. 마지막 밭뙈기를 맡기고 나서는 길이었다. 이제는 그 밭뙈기마저 넘어갈 판이었다.
- 저놈들이 몽땅 다 갖고 갔구만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놈들이어요. 에잇. 부상이 아니라 화적떼구만요. -
좀 전에 끼어들었다가 흠씬 두드려 맞고 고꾸라졌던 김치삼이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저고리가 훌러덩 벗겨져 웃통이 알몸인 체였고 바지는 찢어져 가랑이의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여기저기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씩씩거리고 있었다.
- 나 땜시…… 미안 혀요. -
- 그러면 죽게 냅둬요? 가만 두었으먼 벌써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을 것이어요 -
김치삼은 자신도 강경포로 장사하러 가던 참이라고 했다. 그도 부상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장사할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원통해 했다. 부보상이 장삿길을 막으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 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구만요. -
- 나도 가야것구만요오. -
김석순도 같은 생각이었다. 뱃삯이 잘못되었다며 따지는 것은 별것 아닌 일이었다. 걸핏하면 따지는 일이 있었다. 대부분 따지려다가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군다나 임한석까지 나섰다. 임한석이 누군가. 부보상단의 두령인 접장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했다. 관아의 구실아치들도 함부로 못 하며 재지사족들도 은근슬쩍 눈치를 살피는 지경이라고 했다. 세도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지간한 일에는 나서지 않았다.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렇기에 예삿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김석순과 김치삼은 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군다나 김석순의 사정은 더 딱했다. 자칫하다가는 유리걸식의 형편으로 내몰릴 판이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걷고 또 걸었다.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다. 입속이 바짝 마르고 단내가 났다. 허기가 몰려와 한 발짝도 건너기가 힘들지만 요기 할 처지가 아니었다. 배를 따라잡기 위해 뛰다시피 했다. 저물녘이었다. 겨우 강경포구에 당도했다.
강경포의 저잣거리는 대단했다. 지난번하고 또 달랐다. 어느 틈에 저잣거리가 더 생겨나 있었고 거리마다 주막과 여각이 들어서 있었다. 일본인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쇳덩이로 만든 까만 배가 여러 척이나 정박해 있었다. 보아하니 일본에서 온 것 같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강줄기를 따라 셀 수가 없을 만큼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모두를 합쳐봤자 쇳덩이 배 한 척의 크기보다도 작았다. 작고 초라한 나룻배들이었다.
- 제원에서 온 배는 어딧어요오? -
- 몰르니께 저리 비켜! -
김치삼의 물음에 선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어깨에 쌀가마니를 둘러매고 기진맥진하고 있었다. 더 말을 걸었다가는 쌍욕이라도 튀어나올 기세였다.
- 우덜이 찾아야 것구만요. -
김석순과 김치삼 두 사람은 강줄기를 따라가며 찾아 나섰다.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 훑었다.
- 제원에서 온다면 멀었는디이. 언제 올지 몰러요. -
행인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던져주는 말이었다. 두 사람의 저고리와 바지가 찢어져 있었다. 몸을 움직이면 빨래처럼 펄렁거렸다. 몸통 여기저기에서 핏자국이 비치고 있었다. 누가 봐도 흠씬 두드려 맞은 흔적이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억울한 꼴을 당하고 망연자실 하는 모습이었다. 근래 들어 흔히 보게 되는 몰골이기도 했다.
<03>편에 계속
 |
▲ 이성수 소설가 |
[작가 소개]
이성수 소설가
아호 쾌술(快述)/전북 고창 출생/한국문인협회 회원/수원문인협회 소설분과 위원장/한국소설가협회 회원/소설동인회 스토리소동 회원/장편소설 '꼼수', '혼돈의 계절',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 칠십일의비밀' 외 단편소설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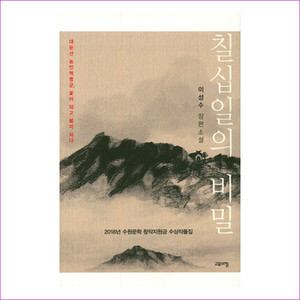 |
▲ 고요아침 刊/값 13,000원 |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ssue Hot] 유럽, 폴란드 '러 드론 격추'에 강력 연대…방공망 강화 논의](/news/data/20250911/p1065582217641578_739_h2.png)
![[News Hot] 박지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아냐…서방유학 추정 아들 은폐"](/news/data/20250909/p1065576049058857_654_h2.png)

![[Issue Hot] '질 나쁜 나랏빚'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news/data/20250908/p1065568328401949_414_h2.png)






